
나는 어릴 적 똑같은 대답만 하는 아이였다.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내겐 친구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신나게 뛰노는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바쁜 척을 했다.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단지 아이들로부터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랬던 것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소심한 마음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랬던 내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 연극을 배우며 나는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지난 1년간 춘천동원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극 수업을 진행했다. 그들을 보는 나는 간혹 내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7월 어느 날이었다. 연극놀이 수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빈 의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 자신이 상상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수업을 했다.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연극 수업이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순수함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김지수라는 아이가 그랬다. 내가 근무한 학교는 춘천의 동원학교라는 곳인데, 그곳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지수는 오른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팔꿈치까지 잘려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수는 자신의 오른팔과 함께 웃음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지수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야, 네가 한번 해볼래?”
“…”
“선생님이랑 함께 나가볼래?”
어떤 이유였을까. 그날까지 웃음 한번 주지 않던 지수는 내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빈 의자를 향해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 할머니… 하늘에 있는 우리 할머니…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리고 흐느꼈다. 지수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를 지켜보던 아이들도 모두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고 교실은 눈물로 넘실거렸다. 그때 내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지수의 곁을 꼭 지키고 싶었다. 지수도 말은 없었지만 그런 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 학교로 처음 온 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해야 한다. 교실 문을 열면서 다짐을 했다. 오늘만은 아이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고.
마지막 수업이라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편지 쓰기였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고마운 사람에게, 미운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수업에서도 역시 지수는 말이 없었다. 처음의 그 얼굴 그대로, 무심하게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덧 수업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포옹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안았다. 화가 났는지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 교실에 처음 들어오던 때처럼, 다시 문을 열고 교실을 빠져나왔다.
그때 교실의 뒷문이 스르륵 열렸다. 두 눈이 빨개진 아이 하나가 빼꼼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눈과 볼이 빨개진 아이가 뚜벅뚜벅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를 다시 꼭 안아주었다.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고 그 아이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울지 마 파이팅!”
어릴 적 나는 울보였다. 조금만 무서워도 울고,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고, 밥을 안 준다고 울었다. 하지만 춘천동원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울보가 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지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 이 글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감동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글_ 연화선 연극예술강사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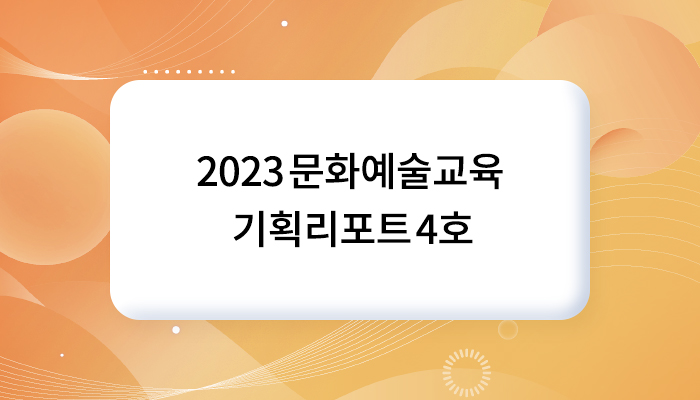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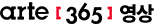
댓글 남기기